[淸河칼럼] 훈풍에 매화 향기 재넘어 오네(風暖梅花度嶺香)
박완규 주필
 유난히 봄을 많이 노래하는 시인 친구가 한동안 바쁘게 살더니 겨우내 몸이 약해졌는지 산골에 홀로 들어가 자연과 호흡하며 몸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최근에 쓴 듯, 메일을 타고 넘어온 ‘홍매화’ 가지가 붉은 향기를 뿜어낸다.
유난히 봄을 많이 노래하는 시인 친구가 한동안 바쁘게 살더니 겨우내 몸이 약해졌는지 산골에 홀로 들어가 자연과 호흡하며 몸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최근에 쓴 듯, 메일을 타고 넘어온 ‘홍매화’ 가지가 붉은 향기를 뿜어낸다.
눈 내리고 내려 쌓여 / 소백산자락 덮어도 / 매화 한송이 그 속에서 핀다 / …… / 덮어버릴 수 없는 / 꽃 같은 그대 그리움 / 그대 만날 수 있는 날 / 아득히 멀고 / 폭설은 퍼 붙는데 / 숨길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 가슴 속 홍매화 한 송이.
무슨 그리움이 그리도 붉은겐지, 짐짓 몸에 든 병보다 더 깊은 그리움을 앓는 것은 아닌지 저으기 의뭉스럽다.
입춘추위가 회초리처럼 매섭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모레면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다. 한 해 24절기 중에 벌써 네 절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새해 아침 담았던 각오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훈풍에 매화 향기 재넘어 오네(風暖梅花度嶺香)’라는 옛 선비의 싯구절이 문득 가슴에 고여와, 산 넘어 약수터 길을 나섰다. 홀로 적막에 젖어 생각의 한 매듭을 다시 매어 볼 요량으로….
대나무는 속을 비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속을 채울 시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듯 쑥쑥 자라 일년이면 성장을 그친다. 속이 비고 높이높이 크다보니 부실해 지기 또한 쉽다. 그래서 매디매디를 만들어 부실해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묶어가며 자란다. 한층 한층 뽑아 올리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다짐하며 크므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게 살아간다.
약수터 가는 길, 볕 바른 곳에서는 황토흙이 푸슬푸슬 풀어져 주르르 주르르 흘러내리고, 버들가지엔 버들강아지가 고물고물 몰려나와 앉아 있다. 어미품을 파고들며 서로 젖꼭지를 차지하려는 아직 눈도 뜨지 않은 강아지 같은…. 버들강아지를 보니 내 몸에도 달달한 물이 오르는 것 같다.
절기란 바로 이런 것인가, 자연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홀로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보니 내 몸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시간이 느껴지네.
그래, 자연의 시간과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 호흡의 리듬을 맞추어 보자. 대나무처럼 절기처럼 다짐이 느슨해지면 다시 한 매디를 묶어가며….
약수터는 아직 산 하나를 넘어야 하지만, 내 몸엔 어느새 달달한 약수가 고여있네. 붉은 매화 한 송이 가슴에 ‘툭’ 터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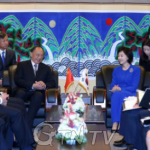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