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칼럼] 조춘행(早春行) 나서 보렷다!
박완규 주필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아마도 속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언덕에 저렇게 봄빛이 가득한데 무슨 조춘이냐.”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화사한 햇볕에 얼굴이 이렇게 그을었는데, 이미 정월 맹춘(孟春)을 지나 오늘이 음력 이월 하고도 나흐레, 벌써 중춘(仲春)에 접어들었는데 때 늦게 무슨 조춘 타령이냐고 나무라고 있을 것이다.
정말이다. 그렇게 언제 벌써 우수도 경칩(驚蟄)도 지나고 춘분(春分)이 목전이구나. 지난 겨울이 하 추워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어깨 움츠려 추워하며 거리를 걷다가, 후욱 한 줌 바람에 몸 부르르 떨었더냐.
곧 다시 방구석에 돌아와 늦은 세월만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언뜻 고개 들어 바라본 먼산이 아직도 그렇게 흰눈 희끗 보이길래 이제껏 끈질긴 겨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라 한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미 봄이라 한다.
희끗거리는 잔설이 있다 하여 봄이 안 올 줄 알았더냐? 남녘 초당(草堂) 처마 끝 낙수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냐? 강물 흐르는 얼음장 밑에서 버들치 피라미들의 흥겨운 은빛 헤엄이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더냐?
뭉클뭉클 피어 오르는 흙냄새가 어머니 가슴같지 아니하더냐? 새싹여린 빛깔에 괜스레 울컥 눈물은 솟지 않더냐? 이마에 묻어나는 봄빛을 정녕 깨닫지 못하겠더냐?
아니다. 봄이다, 봄이 왔다. 봄볕 따습거니, 산으로 가자. 봄 들녘 아지랑은 그리움이고, 봄 바다 일렁임은 눈물이고나. 저기 봄바람은 들꽃 소식. 너희 가슴 풀어헤쳐 거기 엎어져도 좋으리.
냉이 달래 뜯어도 아니 좋으련. 매화 동백 그늘에 취해도 좋지. 이런대도 이제 겨우 조춘이라 이르느냐? 만춘(晩春)이 지난 다음 그 때서야 비로소 이제 날씨 풀려 희라, 봄이로구나, 할 테냐?
봄이 온 줄 정녕 몰랐더냐? 그렇게도 힘들더냐? 아아, 사는 게 그렇게도 힘들더냐?
벗들아, 겨우네 얼었던 가슴 녹이며, 망자가 된 벗 배웅삼아 봄기운 만끽하러 조춘행이나 나서 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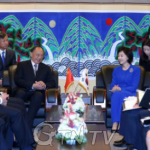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