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칼럼] 겨울 山만 같았으면
박완규 주필
 진짜 갑오(甲午)년 새해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지친 육신과 어지러운 마음을 씻으려 눈 덮인 강원도 평창 백두대간으로 산행을 떠났다. 두터운 외투를 입었어도 옷깃을 여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스산한 삭풍(朔風)이 매섭게 분다.
진짜 갑오(甲午)년 새해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지친 육신과 어지러운 마음을 씻으려 눈 덮인 강원도 평창 백두대간으로 산행을 떠났다. 두터운 외투를 입었어도 옷깃을 여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스산한 삭풍(朔風)이 매섭게 분다.
낙엽 위를 솜이불처럼 덮은 눈이 한낮 햇볕에 녹다가, 겨울 밤 찬바람에 다시 얼어붙는다. 그 위에 또 눈이 내리고, 녹고 얼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눈밭이 깊다. 바람받이 그늘에 쌓인 눈은 한 길을 넘어 대관령 목장 철책이 파묻혀 버렸다.
남으로 내달리는 백두정맥 등뼈 위는 바람과 눈이 빚어낸 추상화 전시장이다. 겹겹이 몰려오는 파도 형상의 눈 층을 지나, 너른 목초지를 뒤덮은 눈밭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거대한 도화지다. 그 위로 배고픈 산짐승들의 발자국 행렬이 길다.
아기 고라니일까, 아니면 산토끼일까. 발자국이 깊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린 짐승이 분명하다. 간격도 멀지 않은 작은 발자국들이 인절미 위에 막 눌러놓은 떡살 무늬처럼 예쁘다. 그 옆으로 종종걸음 친 산새들의 발자국은 무슨 형상의 문자인가.
떼지어 먹이를 찾아 나는 새들의 울음과 바람의 합창은 이 고즈넉한 겨울산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래, 눈 이불 아래 낙엽 옷 속에는 겨울을 견디는 생명들이 있을테지,,,.
옷 벗은 나무들도 이 엄혹한 겨울을 참아내려고 서로 손을 맞잡거나, 혹은 어깨를 겯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려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잉잉거리는 소리는 아무리 추워도 꺾이지 말자는 결의와 다짐이려나.
소나무 잣나무 같은 상록수들은 이고 있는 눈 무게에 지쳐 보인다. 겨울 산이란 원래 그런 모습일 게다. 그럴진대 고갯마루에 서 있는 전파 중계시설 같은 구조물들이 태초부터 있어 온 겨울 산의 모습을 망쳐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선자령 정상에서 알코올 한 모금으로 언 속을 녹이고, 되돌아오는 길에 더 큰 부조화를 발견한다. 눈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이다. 사람의 발자국은 왜 그리 크고 깊은가. 왜 그리 자연에 역행하는 모습인가.
내 일행과 낯 모를 겨울 산행자들의 발자국들은 또 왜 그리 어지러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토록 비자연적이란 걸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은 끝도 한도 없이 자연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인간사란 늘 그렇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깨달음,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게 겨울 산행에서 얻은 값진 선물이건만, 혼탁한 사회로 회귀하는 발걸음은 왜 이리도 무거운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 태권도계를 길들이려는 이 때, 표표히 대의적인 화합과 진정한 독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낼 태권도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이 참에 기득권을 찬탈하려 모사와 협잡을 획책하는 추악한 인간들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력에의 기승이란 이름의 저들의 추잡한 언동일랑 겨울 찬바람으로 얼리고 사악한 마음까지 하얀 눈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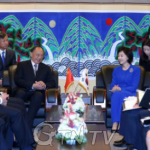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