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㉘>내고와 샤갈
 |
||
“참혹하지만 꽃다운데가 있다.”
80년대 초 명성황후를 구상중이던 내고 박생광(乃古 朴生光)이 경복궁 향원정 옆 황후가 불태워진 자리를 찾아가 남긴 말이다. 마치 그자리에서 조선 최후의 황후를 친견한 듯한 독백이었다. 그 후 내고는 1년간 전심전력을 기울여 기어코 ‘참혹하지만 꽃다운 걸작’-'명성황후’를 완성한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비견할 만한 것을 그리겠다던 내고의 도저한 자존심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 ‘명성황후’가 한국의 게르니카란 별칭을 갖게 된 사연이 이와같다.
내고 만큼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던 화가도 없었던 모양이다. 겉보기엔 사람좋은 할배 모습이었지만 흉중엔 ‘위답비로정상(偉踏毘盧頂上:석가의 이마를 밟다)’의 자존심이 가득해, 인삿말로도 누구 그림이 좋더라는 말을 입밖에 낸 적이 없었단다.
하기야 그만한 자존심이기에 평생을 가난에 핍박받으면서도 한국적 색채에 매달려 결국 말년에 거대한 화업을 이루었을게다.
그런 내고도 적수(?)로 여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샤갈이었다. 그림이 뜻대로 된다 싶으면 “샤갈이 내 적수가 될까”라고 중얼대곤 했단다.(김이환 ‘수유리 가는길’)
내고와 샤갈은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랑팔레 한국미술 특별전에서 운명적으로 해후할 뻔 했다.
그러나 후두암에 걸린 내고는 파리에 가지 못했고, 샤갈은 내고의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그해 3월 타계했다.
병상에서 샤갈의 부음을 들은 내고는 “저승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라고만 했다. 내고는 넉달 뒤 샤갈을 뒤따랐다. 샤갈이 98세, 내고가 81세였다.
내고 박생광과 마르크 샤갈이 가을의 문턱에서 반갑게 마주하고 있다. 지난 달 시작한 샤갈 전시회에 이어 용인 이영미술관에서 ‘박생광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곧 개막된다.
내고의 강렬한 오방색(五方色)과 샤갈의 마술적 색채를 비교하며 두 사람의 저승 해후를 상상해보면 어떨까. 올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각별한 호사일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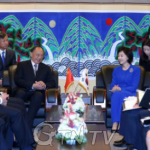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