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칼럼>태권도정치판에 신선바람을 퍼뜨릴지니
 |
||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끝나자마자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랍에서 낡은 부채를 꺼내서 펼쳐 몇 해의 먼지를 털어내니, 거기에는 ‘空山無人 水流花開(빈산에 사람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북송의 대문호 소동파의 명구가 씌여있다.
귀양과 좌천을 거듭하며 한 평생을 주유했으니 아무리 천하의 풍류객 소동파라 한들 어찌 분노와 회한이 없으랴마는, 그럼에도 이런 초탈한 시구를 남겼다. 하여 훗날 숱한 서생 묵객들에게 회자되어 그들 맺힌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거늘, 급기야 시계 2012년 이 목식서생이 편 부채에도 바람을 품은 채 나타난 것이다. 부채를 부쳐보니 과연 먼지의 세속을 벗어난 청량한 계곡 바람이 이는 듯하다.
그러나 부채는 그저 바람만을 일으키는 도구는 아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사에서 부채는 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 전설의 순임금이 오명선(五明扇)이라는 부채를 만들고, 대대로 무당들의 굿에서도 부채는 필수적인 무구였으니 필경 부채는 유서 깊은 신령함을 품고 있음에 틀림없다. 부채가 먼지를 날릴 수 있듯이 재앙을 몰고오는 액귀와 병귀를 쫓는다고 믿었기에 옛사람들은 단옷날 친한 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곤 했다 한다. 이 부채를 염병을 쫓는 부채라는 뜻으로 벽온선(辟瘟扇)이라 불렀다.
삼국시대의 제갈공명은 백우선(白羽扇)을 휘두르며 그 신출귀몰한 계략을 펼쳤으며, 판소리의 소리꾼에게 부채는 장강 같은 서사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유일한 무대 도구이다. 부채는 그저 단순한 도구가 아니어서, 소리광대에게 부채를 빼앗아버리면 문득 목이 턱 막혀서 한 소리도 내지를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쥘부채의 펴지고 접히는 구조가 여자의 정조에 비겨지기도 했던 모양이다. 조선의 기방 풍습에 마음을 주고 싶은 임이 생기면 기생은 자신의 화선(花扇)을 넌지시 임 앞에 밀어 놓았다고 한다. 부채로 표현되는 정이 은근하고 예쁘다.
부채에는 철학도 있다. 조선의 재야 철학자 화담 서경덕은 조정의 중신이었던 김안국이 선물로 보낸 부채에 감사하며 시 두 편을 지은 적이 있다. 이 두 편의 시에는 짧은 서문이 붙어 있는데, 이 서문이란 게 만만찮다. "묻건대 부채는 휘두르면 바람이 난다는데, 바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하는 매우 평범한 듯한, 그러나 심오한 철학적 질문으로부터 서문은 시작된다. 화담은 이 질문으로부터 우주적 기의 운동에 대한 그의 도저한 기철학을 전개한다. 이어지는 그의 시는 철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감성적 운치가 있어 더욱 좋다.
"한 자의 맑은 바람을 초당으로 보내 와/오동나무에 기대어 부치니 그 맛이 별나게 좋다./한 대에 머리끝이 모두 꿰어 있는 줄 뉘 알리오?/천 가닥 가지가 스스로 펼쳐지는구나./형체에 밀리어 기(氣)가 불리어 와/고요한 허공 아래 갑자기 시원하게 통하네."
무더운 한여름, 맑은 바람의 초당과 오동나무 푸른 그늘의 가난하면서도 여유로운 운치를 즐기는 고결한 선비의 여름날이 절로 떠오른다. 하나로 꿰여 있다가 천 가닥으로 펼쳐지는 것은 부채의 형상에 대한 묘사이지만 이것은 또한 온 세상이 쉼 없이 펼쳐지고 접히는 일기(一氣)의 율동이라는 우주관의 적절한 메타포다. 게다가 바람을 일으키니 더욱 그렇다. 기철학의 원조격인 장자 역시 "대개 이 대지가 뿜어내는 기를 바람이라고 한다(夫大塊噫氣, 其名爲風)"라고 하지 않았던가.
날씨도 태권도 정치판도 너무나 숨 막히게 갑갑하고 덥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하는 철 지난 옛 금지곡이 새삼 떠오른다. 부채를 펴 본다. 작은 부채처럼, 우리 손을 떠나 저 높은 곳에 군림하지 않으면서도 천지의 이치와 기운을 불러와 이 폭염의 세상을 시원하게 통하게 하는, 그런 소박하고도 청량한 태권도계를 소망해 본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백성들 더위를 씻어 줘야 할 것이니, 응당 시원한 바람을 온 나라에 퍼뜨려야 할 걸세." 화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새삼 궛전에 와 닿음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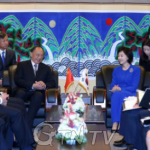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