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적응하기
김흥업 / 한국언론인포럼 회장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인간의 몸에는 털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한번쯤 가져봤을 법하다.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살 수 있는 포유류나 조류 가운데 별나게도 인간만이 알몸으로 진화한 요인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데스먼드 모리스의 유명한 저작 제목이기도 한 ‘털 없는 원숭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별난 종이다. 그 가운데서도 매우 별난 특징은 체모의 퇴화라 하겠다.
자연 상태에서 털이 없으면 추위에 견디기 어렵고, 외부의 충격이나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 생존에 불리한 점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인간이 과감히 털을 포기한 것은 이를 압도하는 이점이나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염에 적응하기 위해, 이나 기생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감을 높이기 위해 등 별의별 가설이 제기돼왔다. 옷과 미용술의 발달이 털의 퇴화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들 그럴듯하지만 2% 부족한 느낌이다. 하나를 택하라면 폭염 적응설에 표를 주고 싶다. 기후변화로 숲이 사라지고 햇볕이 작열하는 사바나로 내몰리자 털북숭이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직사광선을 받는 면적을 줄이고, 털을 벗음으로써 땀을 발산해 체온을 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 정도다. 1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몸에 이상이 생긴다. 40도까지 올라가면 목숨이 위태롭고 33도 아래로 내려가면 동사한다. 인간이 털을 벗은 것은 체온을 올리기보다 내리기 쉽게 적응한 것이고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일 게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4일까지 1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폭염 사고는 2003년 3만5000명의 사망자를 낸 유럽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시대의 대표적인 재앙 가운데 하나다.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에는 실패를 거듭하는 마당이니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혹한과 달리 폭염에 대해서는 거의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노약자나 질환자 등의 간접적 폭염 피해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다시 ‘털을 뽑는’ 노력으로 제2의 폭염 적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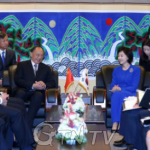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